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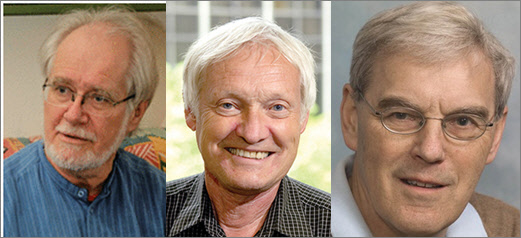
4일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크 두보쉐 스위스 로잔대학교
교수와 조아킴 프랭크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리처드 헨더슨 영국 케임브리지 분자생물학 MRC 연구소 연구원


올해 노벨 화학상의 영예는 생화학 분야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온 '저온전자현미경(cryo-electron microscopy)'을 \개발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자크 두보쉐(Jacques Dubochet)
스위스 로잔대학교 교수와 조아킴 프랭크(Joachim Frank)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리처드 헨더슨
(Richard Henderson) 영국 케임브리지 분자생물학 MRC 연구소 연구원 등 3명을 공동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액 속 생체분자의 화학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저온전자현미경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자현미경은 오랫동안 생명이 없는 물질을 영상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알려져 왔다.
살아있는 시료가 강력한 전자빔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화학 분야는 오랫동안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채워져 있었다.
올해 수상자들이 개발한 저온전자현미경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켰다.
연구자들은 이 장비를 통해 생체분자의 운동을 정지시키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과정을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는 생명의 화학적 이해와 의약품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 리차드 헨더슨 교수는 전자현미경으로 단백질의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획기적인 기술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요하임 프랭크 교수는 이 기술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 그는 전자현미경의 흐릿한 2차원 영상을 분석하고 병합해 또렷한 3차원 구조로 나타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자크 두보쉐 교수는 전자현미경 검사에 물을 도입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전자현미경의 진공 상태에서 증발해 생체 분자를 붕괴시킨다.
1980년대 초 두보쉐 교수는 물을 유리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물을 급속히 냉각시켜 생체 시료 주변의 액체를 고형화시켰고, 이를 통해 생체 분자가 진공 상태에서도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발견들에 힘입어 저온전자현미경은 2013년 원자 수준의 해상도에 도달했으며, 연구자들은 이제 생체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됐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과학 문헌에는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는 단백질부터 지카 바이러스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이미지로 가득 차있다"며 "이에 힘입어 생화학 분야는 폭발적인 발전에 직면해 있으며 흥미진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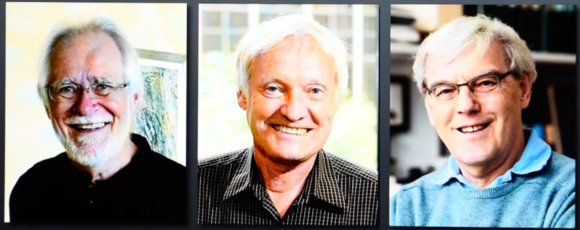
노벨 화학상에 자끄 뒤보쉐 등 3명 공동 수상
위원회는 세 사람이 극저온 현미경 기술을 개발해 생체분자의 고분자구조 결정체를 연구하는데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세 사람은 극저온 현미경을 개발해 생체분자 이미지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된 상을 얻도록 했다.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현미경음 전자빔을 사용하기때문에 생명체에 쏘이는 경우 대상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죽은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노벨위원회 유튜브 캡처]](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0/04/AKR20171004034500009_01_i.jpg)
노벨화학상, 저온전자현미경관찰법 개발 3인등 역대 수상자 명단
(서울=연합뉴스)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자크 뒤보셰(스위스), 요아힘 프랑크(미국), 리처드 헨더슨(영국) 등 3명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용액내 생체분자 구조 결정을 위한 고해상도 저온 전자 현미경 관찰법을 개발한 공로로 이들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1996∼2017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및 수상업적.
▲2017년: 자크 뒤보셰(프랑스), 요아힘 프랑크(미국), 리처드 헨더슨(영국)
▲2016년: 장피에르 소바주(프랑스), 프레이저 스토더트(영국), 베리나르트 페링하(네덜란드)
= 분자기계를 설계·제작.
▲2015년: 토마스 린달(스웨덴), 폴 모드리치(미국), 아지즈 산자르(미국·터키)
= DNA(유전자) 복구 메커니즘 연구.
▲2014년: 에릭 베치그, 윌리엄 E.머너(이상 미국), 슈테판 W.헬(독일)
=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 기술 개발.
▲2013년: 마틴 카플러스, 마이클 레빗, 아리 워셜(이상 미국)
= 복합체 분석을 위한 다중척도 모델링의 기초 마련.
▲2012년: 로버트 J. 레프코위츠, 브라이언 K. 코빌카(이상 미국)
= 심혈관계 질환과 뇌 질환 등에 관여하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GPCR)에 대한 연구.
▲2010년: 리처드 F. 헤크(미국), 네기시 에이이치, 스즈키 아키라(이상 일본)
= 금속 촉매를 이용한 복잡한 유기화합물 합성 기술에 대한 연구
▲2009년: 아다 요나트(이스라엘), 벤카트라만 라마크리슈난, 토머스 스타이츠(이상 미국)
= 세포 내 리보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2008년: 마틴 샬피, 로저 시앤(이상 미국), 시모무라 오사무(일본)
= 녹색 형광단백질의 발견과 응용 연구.
▲2007년: 게르하르트 에르틀(독일)
= 철이 녹스는 원인과 연료전지의 기능방식, 자동차 촉매제 작용 원리 이해에 기여.
▲2006년: 로저 D. 콘버그(미국)
= 진핵생물의 유전정보가 복사돼 전달되는 과정을 분자수준에서 규명.
▲2005년: 로버트 그럽스. 리처드 슈록(이상 미국), 이브 쇼뱅(프랑스)
=유기합성의 복분해(複分解) 방법 개발 공로.
▲2004년: 아론 치카노베르, 아브람 헤르슈코(이상 이스라엘), 어윈 로즈(미국).
= 단백질 분해과정을 규명, 난치병 치료에 기여.
▲2003년: 피터 에이거, 로더릭 머키넌(이상 미국).
= 세포막 내 수분과 이온 통로 발견, 인체 세포로 수분과 이온이 왕래하는 현상 규명.
▲2002년: 존 펜(미국), 다나카 고이치(일본), 쿠르트 뷔트리히(스위스).
=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분자의 질량과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
▲2001년: 윌리엄 S. 놀즈, K. 배리 샤플리스(이상 미국), 노요리 료지(일본).
= 화학반응에서 광학 이성질체 중 하나만 합성할 수 있는 광학활성촉매를 개발,
심장병, 파킨슨병 등 치료제 개발에 공헌.
▲2000년: 앨런 히거, 앨런 맥더미드(이상 미국), 시라카와 히데키(일본).
= 플라스틱도 금속처럼 전기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제로 전도성 고분자를 발명.
▲1999년: 아메드 즈웨일(미국).
= 초고속 레이저광원을 이용, 분자 화학반응의 중간과정 관측에 성공.
▲1998년: 월터 콘(미국).
= 양자 화학에서 밀도 범함수(汎函數)의 새 이론 개발.
존 포플(영국).
= 양자 화학의 계산법인 'CNDO법' 등 개발.
▲1997년: 폴 보이어(미국), 옌스 스코우(덴마크), 존 워커(영국).
= 생체 내 에너지원인 ATP(아데노신 3인산) 관련 효소의 작용 기구 해명.
▲1996년: 로버트 컬, 리처드 스몰리(이상 미국), 해럴드 크로토(영국).
= 탄소원자 60개로 구성된 축구공 모양의 탄소분자 '버키볼' 발견, 초전도·재료 과학의 신분야 개척.
<저작권자(c)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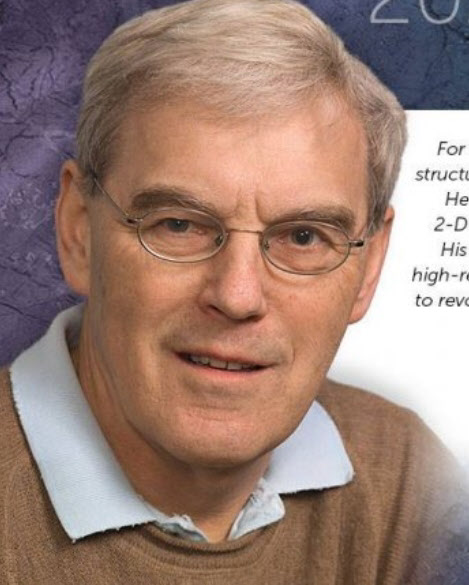
노벨화학상 헨더슨, 학부 때부터 교수 골탕먹인 괴짜
2017년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리처드 헨더슨 영국 케임브리지대 의학연구위원회(MRC) 연구원은 연구를
가장 인상 깊었던 대학시절 기억로 헨더슨 박사는 “교수가 출제한 문제의 오류를 찾아 그걸 논거로 삼아 내 답안지를
학부 시절 헨더슨 박사의 취미는 올드카 수리였다.
그는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현미경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노벨상 수상 역시 생체 분자의 고해상도 구조 결정을 확인
헨더슨 박사가 속한 MRC 분자생물학랩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알리는 한편, 신입 박사과정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노벨화학상은 노벨상의 분야중 하나로 화학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이에게 수상된다.
1901년부터 2014년까지 168명에게 총 106회 수여되었는데 연구인원이 넘치는 물리학이나 생물학과는 달리 생각보다 단독수상이 잦은 편이다.
물리학상의 경우 47명만이 단독수상했고, 생리의학상은 37명뿐이지만,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생리의학상의 두 배에
달하는 63명이 단독수상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단독 수상한 경우는 손에 꼽는다. 프레더릭 생어가 1958년과 1980년 두번 수상하였다.
1916년과 1917년, 1919년, 1924년 1933년, 1940년, 1941년에 수상자가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야 있었겠지만, 1924년과 1933년에는 적당한 수상자가 없었다고. 이때의 \상금은 다시 재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만 50~65세에 수상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우며, 90년대 이후에는 평균 나이가 무려 65세 안팎이 되었다.
20~30년 전 연구 업적으로 수상하는 게 보통이라는 얘기.
성비가 비교적 고른 화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상자는 단 4명으로, 각 1911년, 1935년, 1964년, 2001년에
수상하였다.
수상 분야로는 생화학의 강세가, 특히 9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다.
생화학의 강세로 노벨화학상 수상자 중 의사 출신도 종종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벨의학상에도 다수의 화학자들이 포진..

(서울=연합뉴스) 2017년 노벨화학상 수상 업적인 '초저온전자현미경기법'
(cryo-electron microscopy)은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 등 생체분자의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노벨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도 화학상 수상자.
© AFP=뉴스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 우리가 몰랐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놀라운 능력 10가지 2) 장수 비결 (0) | 2017.10.05 |
|---|---|
| 추석 보름달에 소원빌기 (0) | 2017.10.04 |
| 올해 노벨문학상은 누구 (0) | 2017.10.04 |
| 노벨 물리학상 발표 (0) | 2017.10.04 |
| 라스베이거스 총격범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 속속 드러나 (0) | 2017.10.04 |
